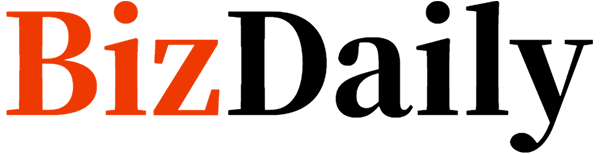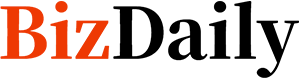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연례 조사로, 공정위는 2010년부터 매년 관련 정보를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 총수일가, 등기이사·미등기임원 참여 증가세
올해 조사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개(18.2%),
총수일가 이사는 704명으로 전체 등기이사 수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5.6%) 대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영’, ‘영원’, ‘농심’ 등의 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이사회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사로 등재될 경우 법적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므로,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총수일가의 1인당 평균 이사 겸직 수는 2.2개로, 총수 본인은 2.8개, 2‧3세는 2.6개의 이사 직함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부영(7.8개)’, ‘SM(5.6개)’, ‘한화·삼표(각 5개)’ 순이었다.
■ 미등기임원 비중 7%… 법적 사각지대 우려
총수일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7.0%**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상장사에서의 비율이 23.1%에서 29.4%로 급증(6.3%p↑) 했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의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하고 있으며,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순으로 겸직이 많았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구조”라며,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비율이 절반 이상(54.4%)**에 달해,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 사외이사 비율 51.3% 유지… ESG위원회 급증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기준(44.2%)을 상회, 비상장사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ESG위원회 설치 비율은 최근 5년간 17.2% → 57.3%로 약 30%p 급증,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보상위원회(-9.5%p), 감사위원회(-9.3%p)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총수일가의 보수 결정 및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소수주주 권리 강화 흐름… 실질적 참여는 여전히 낮아
올해는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전자투표제(88.1%)와 서면투표제 도입도 확대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 상장사(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실제 실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전자투표제 또한 도입률은 높지만, 실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집중투표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개정 상법의 실효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장 자율 감시 유도, 지배구조 투명성 높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매년 분석 결과를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는 책임경영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미등기임원 증가로 인한 **‘보이지 않는 경영 권력’**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는다. 진정한 투명경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사회 중심의 견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