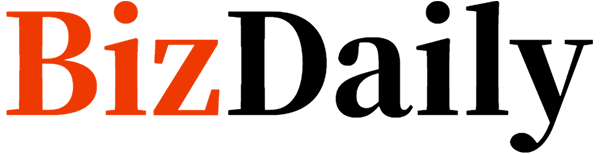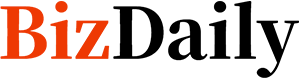■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보험소비자의 대변인으로
“안녕하세요.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후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보험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라이카손해사정(주)의 최원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원정 손해사정사의 이력은 보험업계 안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의 그는 철저히 보험소비자의 편에 서 있다. 보험회사 보상팀 근무 시절, 그는 수없이 많은 포기 현장을 목격했다. 대기업 보험사라는 높은 벽 앞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과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돌아서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계속됐어요.” 이 질문이 그의 진로를 바꿨다.
■ 사고는 예고 없이,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의 가치관을 단단히 만든 경험은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됐다.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했던 일용직 근무 중, 공사 자재에 걸려 크게 다친 아주머니를 도운 일이 있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성도 안내했다.
“그분이 안도하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이 경험은 손해사정사를 단순한 직업이 아닌 ‘책임의 역할’로 받아들이게 만든 계기가 됐다.
■ “보험금을 받았어요”라는 한마디의 무게
손해사정사로서 ‘이 길이 내 길’임을 실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최원정 손해사정사는 망설임 없이 답한다.
“처음엔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하시던 분들이, 보상 이후 밝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주실 때요.”
받지 못할 것이라 체념했던 보험금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는 이 직업이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임을 매번 확인한다.
■ 보험사 구조를 아는 손해사정사의 강점
최원정 손해사정사는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교통사고, 질병, 상해사고 등 일상 속 신체사고 전반을 다룬다. 보험사 보상팀 근무 경험은 그의 가장 큰 무기다.
보험사의 내부 기준과 절차를 알기에, 소비자가 어디서 막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 여기에 갑상선 질환 수술을 직접 겪은 경험은 공감을 더한다.
“사고 이후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기에, 항상 가족의 일처럼 사건을 봅니다.”
■ 어려운 보험, 쉽게 설명하는 사람
상담 과정에서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보험 용어’다. 약관 속 법률·의학 용어는 소비자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된다. 그는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쉬운 언어로 풀어낸다.
“본인 상황을 이해해야 선택도 할 수 있거든요.” 설명은 그의 손해사정 철학의 핵심이다.
■ 불가능에 가까웠던 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혈액암 의심 사망 사건이다. 정밀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보험금이 거절됐고, 여러 손해사정 법인에서도 어렵다는 답을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의무기록과 검사 자료를 집요하게 검토했고, 주치의로부터 혈액암 진단을 이끌어냈다. 결국 보험금 지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무도 맡지 않으려 했던 사건을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말에, 이 일이 왜 필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 공정함, 손해사정사의 본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공정함’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사실과 근거로 판단하는 것.
“때로는 소비자의 기대보다 약관이 냉정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그는 말한다.
■ 변화하는 업계, 더 똑똑해지는 소비자
최근 손해사정 업계는 공정성 강화 흐름 속에 있다. 금융당국의 위탁 제한과 함께, 유튜브·SNS를 통한 정보 확산으로 보험소비자도 빠르게 스마트해지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대해 그는 단호하다.
“기술은 보조일 뿐, 사람의 불안과 삶까지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신뢰가 가는 손해사정사로 기억되고 싶다”
최원정 손해사정사가 그리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는 명확하다. 화려한 전문가가 아니라, 사고 이후 막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의뢰가 올 때마다 어떤 사고였을지 마음이 먼저 졸아듭니다.”
그는 오늘도, 복잡한 절차 속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을 뛰고 있다.
■ 기자의 한마디
보험은 약관의 언어로 쓰여 있지만, 사고는 사람의 삶 위에 남는다. 최원정 손해사정사의 이야기는 ‘보상’이라는 제도 뒤에 숨은 감정과 책임을 다시 보게 한다. 보험회사 출신이라는 이력은 그를 보험사의 편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구조를 알기에, 소비자의 약함을 더 정확히 짚어낸다.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에서도 “안 된다”는 말 대신 “해보겠다”를 선택한 그의 태도는 손해사정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기술과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고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인터뷰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